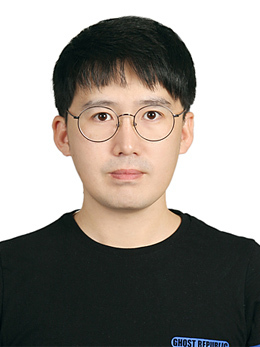
최근 AI디지털교과서를 주교재가 아닌, 보조 자료로 분류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AI교과서를 선제 도입한 학교들이 곤란한 입장에 빠졌다. AI교과서가 학생들의 주교재로서 적당한지 충분히 논의가 안 된 시점에서 무작정 도입하는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기자는 이런 현상이 AI와 같은 신기술 활용이 무조건 좋고, 선제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혹은 다른 나라)에 뒤쳐진다는 불안감이 낳은 조급함의 결과라고 본다. 우리는 지금 전세계에서 쏟아지는 AI찬양 글에 판단력을 잃고 있는 건 아니지 걱정된다.
AI는 절대 교육이나 인간의 발전에 본질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AI관련 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듀얼브레인’(이선 몰릭 지음, 상상스퀘어)에도 AI에 무분별하게 의사결정을 맡기면 인간의 판단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AI를 버팀목이 아니라 보조 도구로 사용해야한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의 모든 작업(본질적인 내용)도 AI에 맡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듀얼 브레인’ 책에는 AI의 의존성을 실험하기 위해 한 그룹에 창의적인 과제(ex, 스포츠를 겨냥한 새로운 신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10개 이상 제시하라 등)를 주었을 때 사람들이 AI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여부를 실험했다.
“실험데이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다소 걱정스러운 점이 발견됐다. 우리는 컨설턴트들이 직접 과제를 수행하면서 AI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AI가 대부분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실험 참가자 대부분은 주어진 질문을 그대로 AI에게 전달했고, AI에게서 답을 얻었다. (중략) AI와 함께 일할 때는 위험이 따른다. 우리 자신을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 위험도 있지만, AI를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듀얼브레인 180page)
AI에게 모든 일을 맡길 경우 부작용이 많이 나타난다. 그 책에는 AI에게 전적으로 회사의 신입을 뽑는 채용을 맡겼을 경우, 일부 뛰어난 지원자들을 놓친 실험도 소개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를 직접 찾는다면 AI에 맡길 때보다 시간은 오래 걸릴지언정, 더 적절한 자료를 찾을 확률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AI에 일을 맡기면, 진짜 좋은 자료를 놓칠 위험도 있다는 말이다. 일의 질적인 측면을 볼 때, AI는 ‘평균치’의 일만 한다는 말이 있다. 적절하고 좋은 답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또한 AI에 너무 의존하면 인간의 장점과 역량이 퇴화될 우려도 있다. 책에는 그런 영역 중 하나로 ‘글쓰기’를 언급했다. “글쓰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활동으로 자신만의 통찰, 경험, 목소리를 글로 풀어내는 일이다. 이 작업을 AI에 맡기면 아무리 뛰어나고 정교하더라 인간적인 감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 게다가 글쓰기라는 행위는 자기 발견의 여정이자, 생각을 명확히 정리할 기회이며, 주제에 깊이 몰입할 방법이 되기도 한다. AI주도권을 넘기면 이런 풍요로운 경험을 잃게 될 지도 모른다. ”(듀얼브레인 186page)
기자의 생각에 AI는 단순·반복적인 일만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 현장에서 AI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본질적인 영역은 인간이 직접 하고 AI는 그저 보조도구로만 사용해야할 것이다.
그런 기준에서 생각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AI를 잘못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회사나 학교 과제에서 발표한 PPT를 AI로 했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자신이 발표할 내용의 개념과 순서를 AI가 정하면 좋은 자료가 나올 수가 없다. 자신의 생각이 반영된 개념의 흐름에 따라 PPT를 만들어야지 가장 논리적이고 자연스런 PPT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보조적인 의미의 디자인이나 단순 표 정리는 AI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AI를 활용할 때, 이 작업이 단순·반복적인 것인지, 본질적인 영역인지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에만 AI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