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황원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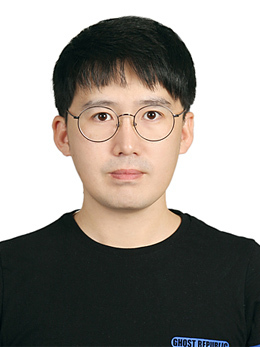
지난 9월 창원복지재단은 창원시청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창원지역 은둔형 청년의 구체적 숫자를 발표했다. 창원복지재단은 ‘창원시 고립청년 기본계획(2026∼2030)’ 연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재단이 지난 2023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창원지역 고립청년은 약 6600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창원시 청년인구(15~34세)의 2%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근 은둔형 청년뿐만 아니라 은둔형 중년 또한 숫자가 많다는 기사를 봤다.
특히 중년 은둔형의 경우 고독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 방송에서 50대 은둔형 남성의 고독사를 다뤘다. 10평이 채 안 되는 원룸 바닥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장판은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고, 주방에는 먼지가 쌓여있었다. 사진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슬펐다.
은둔형 청년과 중년을 다룬 다큐를 봤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성이 결여됐고, 큰 시험이나 직장생활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 중년의 경우 50대에 들어서, 직장에서 퇴직을 강요받아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독서모임에서 만난 한 40대 여성은 “남성보다 여성이 고독사에 더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결혼을 하지 않은(또는 시기를 놓친) 중년 여성은 나이가 들어 경쟁력을 잃으면 회사에서 나와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중년 남자의 경우 실직하더라도 막노동이라도 할 수 있지만, 여성은 일자리가 제한되고 바로 취약계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은둔형 청년과 중년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실패에 취약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최근 경남교육감 후보들과 인터뷰 하면서 현재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생각했다.
먼저 어릴 때부터 학생들의 꿈을 강조하는, 높은 이상을 심어주는 교육이 문제라는 분석이 있었다.
요즘은 대부분 4년제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학과에 희망하면서, 사회적 인식이 좋은 일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학생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 생각할 겨를 없이, 부모나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을 얻지 못하면 좌절하고 만다.
이와 관련해 한 교육감 후보는 “학부모의 기대나 사회적 평판만 신경 쓰지 않으면, 학생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며 “대학을 가지 않거나, 전문대학을 나오더라도 사회에 기여할 일이 많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은둔형 청년·중년이 있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하고, 잔소리를 지나치게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자녀를 존중하거나, 기다려주지 않고, 볼 때마다 ‘빨리 정신 차려라’고 닦달했다. 아예 지원을 끊어야 집밖에 나온다고 생각하거나, 심할 경우 정신병원에 넣어야 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봤다.
부모도 사회과학(심리학)에 바탕을 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녀가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야단치기’ ‘잔소리하기’ 등의 방법이 항상 옳지 않다.
대학 때 배운 심리학자 윌리엄 글래서의 선택이론에 따르면 자녀에게 부모의 입장을 가장 잘 전달하는 방법은 자녀와의 ‘좋은 관계’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잔소리를 되도록 하지 않고, 자녀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은둔형 청년에게는 대인관계에서도 많은 문제가 보였다.
이와 관련해 한 교육감 후보는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남을 배려하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스포츠를 통해 깨닫게 하는 등 학교에서 협동을 강조하는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가 많다보니 밥상머리 교육할 시간이 없고, 자녀에게 죄책감이 있어서 혼내야 할 땐 못 혼내는 것도 사회성 결여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