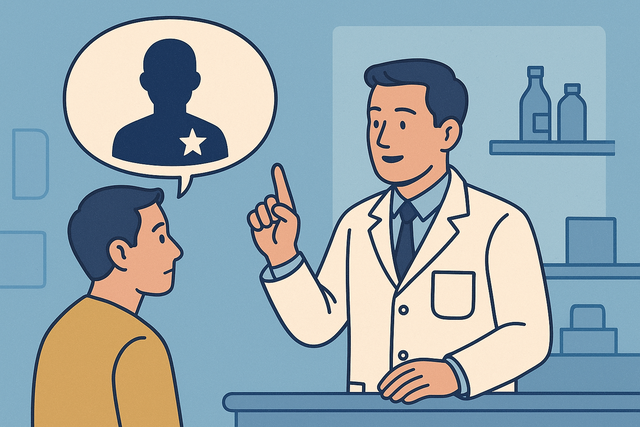

감기 기운이 있어 동네 약국을 찾은 당신. 약사에게 증상을 설명했더니 작은 감기약 박스를 하나 내민다. ‘이걸로 감기가 나을까? 병원에 갈까?’라고 생각하던 찰나 약사는 “제가 30년 경력인데, 이 약 드신 환자분들은 다 깨끗이 나았답니다”라고 말한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 불안은 사라진다. 약의 성분이나 부작용보다 ‘30년 경력’이라는 말이 더 강력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문성, 직위, 명성 등 권위를 가진 사람의 말을 과도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때로는 그 판단이 위험하거나 비합리적이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음에도 말이다. 이것이 바로 ‘권위자 편향’(Authority Bias)이다.
권위자 편향은 인간이 가진 인지적 지름길 중 하나다. 우리는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다 분석하고 판단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문가니까 맞겠지’라는 편의적 판단을 선택한다.
문제는 이 판단이 허술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인기 방송인이 소개한 건강 보조식품이 폭발적으로 팔리지만 정작 의학적 근거는 부족한 경우나 유명 유튜버가 투자하라고 말한 코인이 순식간에 폭락하는 경우가 그렇다. 권위자는 종종 진짜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고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판단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지역에서도 이 편향은 다양한 문제를 낳는다. 특정 인물의 명성이 정책의 방향을 좌우하고 전문가 몇 명의 발표만으로 지역 개발 사업이 정당화되기도 한다. 시민 토론과 검증 과정은 생략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당연히 맞겠지’라는 분위기가 공론장을 잠식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약화를 초래한다. 정책은 논리와 근거로 평가받아야지, 발언자의 ‘직함’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권위자 편향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선 ‘정보’와 ‘말하는 사람’을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 ‘누가’ 말했는지 보다 ‘무엇을’ 말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또 반대 의견을 의도적으로 찾아보는 태도도 필요하다. 전문가가 어떤 의견을 냈다면 그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도 대부분 존재한다. 그 반대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권위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협력과 토론 중심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바꿔야 한다. 전문가 의견은 참고일 뿐 정답이 아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권위는 필요하다. 하지만 권위는 검증을 대신할 수 없다. 우리가 권위를 경계할 때 비로소 권위는 건강해지고 민주적 토론은 활기를 띤다. 누군가의 이름과 직함은 진실의 증거가 아니다. 진실은 언제나 질문하는 사람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