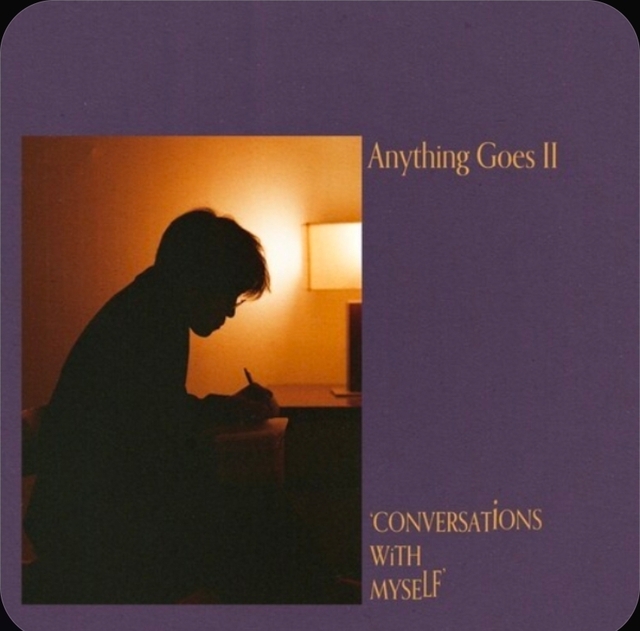

개인적으로 힙합 음악을 좋아한다. 그래서 좋아하는 래퍼들이 앨범을 내면 빠짐없이 들어보는 편이다. 그런데 몇 달 전 래퍼 ‘매드클라운’이 발표한 앨범 ‘Anything Goes II’는 내게 큰 충격과 울림을 줬다.
‘올해에도 죽을 겁니다. 통계적으로 하루에 39명, 두 시간에 3명. 일 년에 1만 4400명. 내 주변의 한 명쯤은 죽을 겁니다.’
매드클라운 특유의 ‘때려 박는 랩’을 기대하면서 앨범을 틀었는데, 첫 곡부터 힙합 가수가 랩은 안 하고 갑자기 누군가 죽을 거라며 듣는 이에게 따지듯 ‘말’을 하기 시작한다. 약간 화가 난 듯한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 안타까움, 울부짖음, 슬픔, 분노 등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이 앨범은 단순한 음악 이상의 울림을 준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사람들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살하지 않고 힘을 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앨범을 듣고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살았으면 좋겠다.” 등.
이 솔직한 외침은 음악을 듣는 우리에게도 묵직한 책임감을 남긴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현실과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다. 통계가 말해주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는 1만 4872명으로 전년 대비 894명, 6.4% 증가하며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나이대별로 보면 40대에서 사망 원인 1위가 자살(26%)로 암(24.5%)을 제친 것도 충격적이다. 또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도 지난해 29.1명으로, 전년 대비 1.8명(6.6%) 상승했다고 한다. 이는 OECD 평균(약 10명대)의 거의 세 배에 이르는 수치로, 한국이 여전히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매드클라운이 음악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간절함은 실제로 생존의 위기에 놓인 수많은 사람의 삶과 맞닿아 있다. 그는 비트와 목소리, 가사를 통해 “살아 있어 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반복한다.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 절망을 말하고 동시에 희망을 건넨다.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이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고통에 시달리는 이웃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모른다. 자살은 결코 개인의 약함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 구조적 어려움, 재정적 압박, 외로움, 정신건강의 문제 등 복합적 요인이 얽혀 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정책적 변화가 우선 필요하다. 국가와 지자체는 자살 예방 전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 정신건강 상담 인프라 확대, 지역 사회의 자살 예방 자원 강화가 시급하다. 정부가 종교계, 지역 사회 지도자들과 협력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 정부는 종교 지도자들과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협약을 맺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과 지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매드클라운의 앨범이 일종의 ‘생명의 외침’이라면 우리 사회는 그 외침에 답해야 한다. 먼저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자살 예방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역 사회, 학교, 직장, 가족 모두가 함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의 메시지다. 이 앨범 두 번째 수록곡 ‘죽지마’의 가사를 보면 ‘완벽하게 안 살아도 돼’, ‘눈앞이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땐 넌 그냥 멋진 선글라스를 낀거야’,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계속 살아야 될 이유를 내가 한 번 말해볼게’, ‘한 시간만, 한 달만 더 살아보자’ 등 구구절절한 위로가 이어진다.
그가 자신의 정규 앨범에 이런 가사를 쓴 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자”, “지금 이 순간 견뎌보자”는 메시지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실제 생명을 지키는 힘이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의 음악을 통해 우리는 절망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살아갈 이유를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자살이라는 어두운 주제를 마주할 때, 우리는 쉽게 외면하고 싶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매드클라운처럼 목소리를 내는 예술가가 있고, 그 메시지를 듣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지역사회에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이웃이 있다면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
우리는 노래를 단순히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울림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 ‘살아 있어 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할 수 있는 사회, 절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지역이 되기를 바란다. 매드클라운의 진심 어린 메시지가 우리 모두의 삶에, 그리고 지역 사회에 작은 변화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